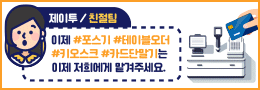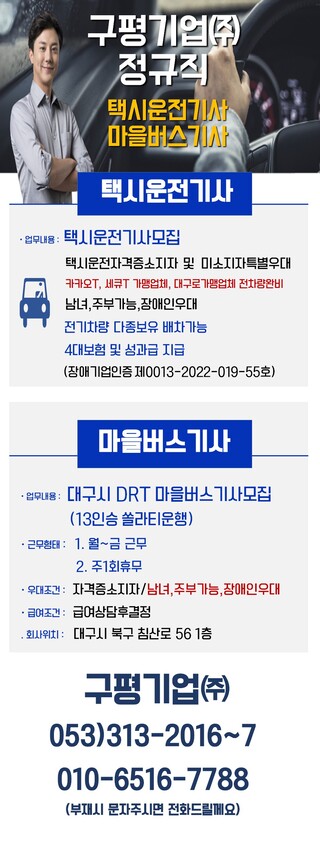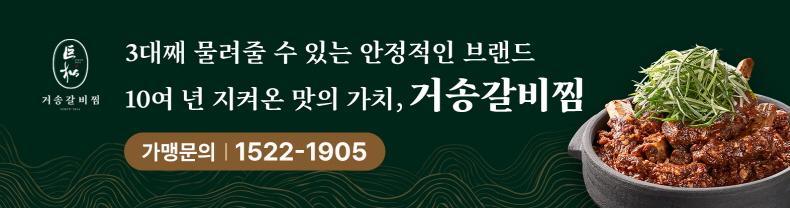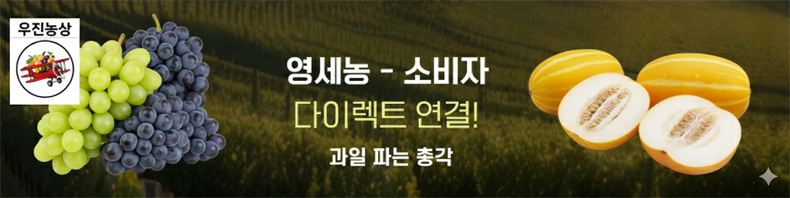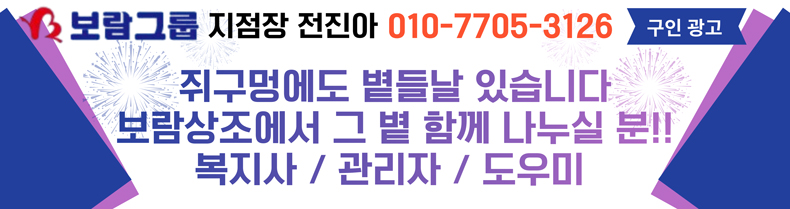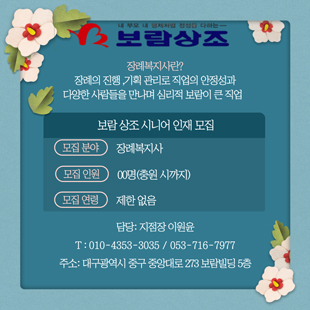일제강점기 조선왕실 문헌을 관리했던 이왕직(李王職)의 체계적인 도서 분류 방식이 오늘날 장서각의 도서 분류 체계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문헌연구실의 박철민 연구원은 최근 한국서지학회가 발간한 『서지학연구』 제102집에 「이왕직의 봉모당 봉안 영조어제첩 관리와 분류 체계」 논문을 게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학계에 소개했다.
해당 논문은 정조 초기부터 봉모당에 봉안된 영조어제첩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됐고,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도서 관리 체계가 어떻게 후대에 전승됐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다. 영조어제첩은 조선 영조가 지은 시문, 교지, 고명 등 자필 문헌으로 구성된 문서집으로,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통치 이념을 담은 핵심 사료로 평가된다.
박 연구원은 논문에서 “이왕직은 영조어제첩을 단순한 보존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서명·내용·장황(裝潢)·간행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류 체계는 단순한 목록 정리에 그치지 않고 실물 문헌에 적용됐다. 표지에는 분류 정보를 담은 첨지가 부착됐고, 표지 이면에는 띠지를 붙여 관리의 일관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였다.
논문에 따르면 이왕직이 관리한 영조어제첩 대부분은 현재 장서각에 전래되고 있으며, 일부는 문화재관리국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됐다. 특히 이왕직의 분류 체계는 1972년 장서각에 새로운 분류 체계가 적용되기 전까지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화재관리국의 공식적인 도서 관리 기준으로 사용됐다. 이로써 이왕직의 방식은 현대 왕실문헌 관리 체계의 기틀이 됐음을 보여준다.
연구는 봉모당 문헌의 상징성과 함께, 실제 문헌 분류 방식이 후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봉모당에 봉안됐던 문헌은 국왕의 어제·어필·유서·고명·지문 등 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서들이 주를 이루며, 이들의 체계적 관리 여부는 곧 왕실 기록문화의 전승을 의미한다.
논문 말미에는 『奉謨堂英祖御製帖目錄』과 현 장서각 청구기호 대조 예시,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 소장본 목록 등 부록이 함께 제시돼, 실증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고문헌 정리 수준을 넘어,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 이어진 왕실문헌 관리 체계의 연속성과 제도적 맥락을 밝혔다는 점에서 서지학뿐 아니라 기록관리학, 문화유산정책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박철민 연구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문헌연구실 소속으로, 왕실문헌 실물 분석과 도서 관리 체계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논문은 2025년 4월 22일 투고돼 5월 29일 최초 심사를 거친 뒤, 6월 5일 게재 확정됐으며, 현재 『서지학연구』 제102집 5∼34면에 수록돼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