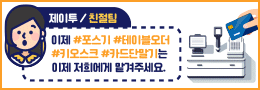고인쇄
섹션이슈
-

대구 서각의 맥을 잇는 미목(美木) 이주강 선생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 서각의 전통을 지켜온 미목(美木) 이주강 선생은 평생을 서각에 헌신하며 우리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앞장서 왔다. ■ 서각과의 인연, 그리고 입문 이주강 선생이 서각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30대 중반 무렵이었다.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시절, 초등생 아들과 함께 서예를 배우던 중 계헌 이상태 선생의 문하에서 서각을 접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마치 신세계를 본 듯 서각에 빠져들었다”는 그는, 은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서각에 대한 갈증을 느끼던 중 수소문 끝에 청사 안광석 선생을 만나게 되었고, 수년간 서울을 오가며 전통 서각의 진수를 전수받는 행운을 얻었다. 이후 그는 미목서각연구실을 열고 본격적인 창작 활동에 나섰다. 연구실은 곧 입소문이 나면서 작품 주문이 쇄도하는 작업의 장이 되었다. ■ 기능에서 예술로, 서각의 위상 확립 1979년 대덕서각전을 통해 첫 작품 세계를 선보인 그는 “서각은 단순히 문자를 새기는 기능이 아닌, 상징을 담는 예술”이라 강조해왔다. 실제로 그는 기능적 차원에 머물던 서각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서예와 서각을 함께 갈고 닦았다. 1985년에는 대구서각연구회(현 미목서각회)를 발족해 격
- 안정주 기자
- 2026-01-02 21:05
-

전통 판각, 개인 창작이 아닌 ‘출판의 언어’로 읽어야 하는 이유
전통 판각을 두고 종종 개인 예술가의 창작 행위로 이해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적·출판사적 관점에서 보면, 판각은 본래 개인의 미적 표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출판과 복제를 전제로 한 사회적 기술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명확히 구분된다. 판각은 단순히 나무를 새기는 기술이 아니다. 판각은 책을 만들기 위한 도구, 다시 말해 출판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정이었다. 동아시아의 출판 문화에서 판각은 ‘작품’이 아니라 ‘매체’였고, ‘표현’이 아니라 ‘전달’의 기술이었다. 출판을 전제로 한 판각의 탄생 목판 인쇄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의 판목으로 수십, 수백 권의 동일한 내용을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 소장의 예술품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지식과 사상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기술였다. 조선 시대의 경전, 불서, 의서, 문집, 향약서 대부분은 판각을 통해 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판각자는 저자가 아니었고, 창작자가 아니었으며, 출판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자였다. 판각의 목적은 ‘나만의 표현’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정확히, 오래, 많이 남기는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판각은 개인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출판 행위의
- 안정주 기자
- 2025-12-28 19:56
-

조선 후기 ‘완영책판’,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재조명, 전라감영에서 제작된 목판, 증수무원록
조선 후기 전라감영(완영)에서 제작된 책판, 이른바 ‘완영책판’이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지닌 가치가 학술적으로 재조명됐다. 김화선 전북대학교 과학문화연구센터 연구원이 발표한 「조선 후기 완영책판의 현황과 기록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 검토 – <증수무원록대전>, <증수무원록언해> 사례를 중심으로」(『인문콘텐츠』 제76호, 2025)는 조선 후기 지방 행정과 법제 운영 속에서 제작·활용된 완영책판의 실태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완영책판은 총 11종, 5,058판에 달한다. 여기에는 <동의보감>, <사기>, <사략>, <호남삼강록>, <성리대전>, <율곡전서>, <자치통감강목>, <주서백선>, <주자대전> 등 주요 유교·의학·역사서와 함께, 조선의 형사·사법 체계를 보여주는 <증수무원록대전>과 <증수무원록언해>가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증수무원록대전>과 그 언해본인 <증수무원록언해>에 주목했다. 이 두 저서는 원나라 왕여가 편찬한 『무원록』을 바탕으로 세
- 안정주 기자
- 2025-12-26 05:40
-

훼손 속에서도 이어진 법보의 역사, 한국 사찰 ‘판전(板殿)’의 가치와 계통을 조명하다
국내 사찰에서 불교의 삼보(三寶) 가운데 하나인 법보(法寶)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불상과 전각 중심의 불보, 승려 공동체인 승보에 비해, 경전과 이를 담아온 책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박광헌 대구대학교 교수의 연구 「한국 사찰의 판전」은 국내 사찰 판전의 역사적 의미와 계통을 종합적으로 조명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3월, 한국서지학회가 발행하는 서지학연구 제101호(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총 23쪽 분량에 걸쳐 한국 사찰 판전의 형성과 전승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고려대장경에서 화엄경까지, 판전의 중심을 따라가다 논문은 먼저 고려대장경판을 보관하기 위해 조성된 판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대장경 보관 사찰로 잘 알려진 해인사의 장경판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부인사 판전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조명하며, 대장경 판전이 단순한 보관 공간이 아니라 국가적·종교적 상징 공간이었음을 짚는다. 이어 『대방광불화엄경소』 120권본 경판을 보관한 송광사와 쌍계사의 화엄전, 그리고 『대방광불화엄경소초』 경판이 전승된 징광사·영각사·봉은사로
- 안정주 기자
- 2025-12-26 05:08
-

독립출판을 꿈꾸는 기자라면, 정안뉴스 칼럼으로 시작하세요
독립출판을 준비하는 기자와 예비 작가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열렸다. 정안뉴스가 칼럼 연재를 기반으로 한 작가·기자 모집에 나섰다. 책을 쓰고 싶지만 막막한 시작 앞에서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원고 기획, 독자 반응, 콘텐츠의 지속성 등 출판 이전에 넘어야 할 벽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안뉴스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에 주목해, 칼럼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립출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정안뉴스의 칼럼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지역 이야기, 현장 기록, 개인의 경험과 통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등 자신만의 시선이 담긴 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자는 칼럼을 통해 자신의 필력과 주제를 검증받고, 독자와의 소통 속에서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칼럼 연재는 단발성 글쓰기가 아닌, 책 한 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축적의 과정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정안뉴스는 칼럼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정리, 기획 방향 설정, 독립출판을 염두에 둔 글 구조화까지 단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안뉴스 관계자는 “이제 기자는 기사만 쓰는 역할을 넘어, 기록자이자 작가로 성장해야 하는 시대”라며 “칼럼은 가장
- 안정주 기자
- 2025-12-26 04:44
-

팔만대장경 정신을 잇는 장경도감의 숨결, 그리고 ‘정안(鄭晏)의 공덕’
경남 합천 해인사는 천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품어온 곳이다.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이라 부르는 이 방대한 목판 경전은 고려 시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한 불교 경전을 넘어 민족의 정신적 토대이자 세계가 인정한 과학·예술·신앙의 결정체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 제작 과정에는 국가 기관이었던 장경도감, 그 산하에 설치된 남해분사도감 등 여러 조직과 수많은 장인, 후원자들이 참여했다. 그중에는 불사의 후원자이자 정이품 참지정사를 지낸 정안이라는 인물도 있었다. 오늘날 해인사에 남아 있는 ‘정안(鄭晏)의 신위(神位)’는 그가 팔만대장경 판각에 기여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다시 말해 팔만대장경은 한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거대한 공동 프로젝트였음을 상징한다. 현대의 ‘장경도감’… 해인사에서 이어지는 판각의 전통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단지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최근 들어 합천 해인사 인근 옛 해인초등학교 치인리 부지에서는 ‘현대판 장경도감’이라 불릴 만한 교육·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팔만대장경 판각 기술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 마
- 안정주 기자
- 2025-12-07 18:40
-

완판본문화관, ‘완판본 <별춘향전> 판각 기념전’ 개막문자, 손끝으로 이어지다-갑골문에서 한글까지
전주 완판본문화관이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특별전시 ‘완판본 <별춘향전> 판각 기념展―문자, 손끝으로 이어지다’를 개최한다. 대장경문화학교와 완판본문화관이 공동 주최하고 전주시와 한국한자연구소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시민 각수가 직접 새긴 목판을 중심에 두고 한국 목판 인쇄 문화와 중국 갑골문 문화를 한자리에 잇는 국제 교류전으로 마련되었다. ‘문자, 손끝으로 이어지다―갑골문에서 한글까지’는 문자와 기록이 모두 인간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자 탄생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갑골문에서부터 조선 후기 한글 인쇄문화의 결정체인 완판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록은 인간의 손을 통해 새겨지고 전승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전주 시민 각수가 재현한 『심청전』, 『주해천자문』, 『갑골천자문』, 『별춘향전』 등 다양한 목판과 서책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전주는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출판·인쇄 기능이 집적된 기록문화의 중심지였다. 완판본은 한글과 한자를 아우르며 민중의 감성과 언어를 생생히 담아낸 대표적 인쇄물이다. 이 가운데 『별춘향전』은 가장 아름다운 한글 고전소설로 평가되는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시민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8:23
-

정조의 철학적 역작 『어정주서백선』, 주희·이황 사상 계승한 100편 선집
조선 후기 문예부흥의 군주 정조(正祖)가 직접 주도한 철학 문헌 선집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강순애 한성대 명예교수의 논문을 통해 학계에 소개됐다. 이 논문은 최근 한국서지학회가 발간한 『서지학연구』 제102집에 수록됐다. 『어정주서백선』은 정조가 1794년 직접 주요 내용을 발췌하고, 신하들에게 교감을 맡겨 6권 100편으로 엮은 유학 문헌이다. 주희(朱熹)의 『주자대전』과 이황(李滉)의 『주자서절요』를 바탕으로 하여 정조의 철학적 관점이 녹아든 편찬물이자, 조선 유학의 집대성이기도 하다. 강 교수에 따르면 정조는 왕세손 시절인 1767년부터 편찬 준비에 착수해, 1794년 한만유에게 초집본을 보이며 검토를 명했고, 이만수·이시원·최광태 등에게 인명, 지명, 훈고, 출처 등을 교감하게 해 본문에 첨기했다. 이후 권별 체제는 주제별로 배열하고, 동일 인물의 편지는 한 권에 함께 묶었다. 논문은 100편의 서간을 9가지 주제별로 분류했다. 시사출처 23편, 왕장문답 14편, 지구문인문답 34편 등이며, 이는 이황의 분류 방식과 비교해 체계적인 계승을 보여준다. 각 편에는 두주(頭註) 형태의 주석이 붙어 난해한 내용을 해설하고 있
- 안정주 기자
- 2025-09-20 23:18
-

이왕직의 영조어제첩 관리 방식, 현대 장서각 분류 체계의 기틀 마련
일제강점기 조선왕실 문헌을 관리했던 이왕직(李王職)의 체계적인 도서 분류 방식이 오늘날 장서각의 도서 분류 체계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문헌연구실의 박철민 연구원은 최근 한국서지학회가 발간한 『서지학연구』 제102집에 「이왕직의 봉모당 봉안 영조어제첩 관리와 분류 체계」 논문을 게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학계에 소개했다. 해당 논문은 정조 초기부터 봉모당에 봉안된 영조어제첩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됐고,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도서 관리 체계가 어떻게 후대에 전승됐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다. 영조어제첩은 조선 영조가 지은 시문, 교지, 고명 등 자필 문헌으로 구성된 문서집으로,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통치 이념을 담은 핵심 사료로 평가된다. 박 연구원은 논문에서 “이왕직은 영조어제첩을 단순한 보존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서명·내용·장황(裝潢)·간행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류 체계는 단순한 목록 정리에 그치지 않고 실물 문헌에 적용됐다. 표지에는 분류 정보를 담은 첨지가 부착됐고, 표지 이면에는 띠지를 붙여 관리의 일관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였다. 논문에 따르
- 안정주 기자
- 2025-09-20 22:59
-

임천 칠산서원 책판과 부여 강동공 일기,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여군은 6월 20일 자로 임천 칠산서원 책판과 부여 강동공 일기가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임천 칠산서원 책판’은 유계 저술의 책판으로 유계의 학문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조선 후기 목판 출판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가례원류(家禮源流)' 및 '가례원류속록(家禮源流續錄)', '계사왕복서(癸巳往復書)', '시남선생문집(市南先生文集)', '시남문집별집(市南文集別集)', '시남선생연보(市南先生年譜)'로 구성되어 있다. ‘부여 강동공 일기’는 조선 후기 활동한 부여 출신 정언욱의 사환일기이자 생활일기이다. 1751년부터 11년간 기록된 일기로 민속과 세시풍속, 날씨, 지진, 유행했던 질병과 치료법, 물가 등 당시 생활사의 다양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 부여지방 물론 18세기 중반의 조선시대 생활사의 세부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부여군 관계자는 “'임천 칠산서원 책판' 및 '부여 강동공 일기'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부여군의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
- 안정주 기자
- 2025-06-20 10:30
-
1

[인물인터뷰] 베델리엄열방센터 최미지 목사를 만나다
-
2

[인물인터뷰]695만뷰 영상의 주인공 '윤나무, 내가 대인기피증을 이겨낸 방법'
-
3

GTX-B노선 최대 수혜지, 마석역 바로 앞 ‘마석역 극동스타클래스 더 퍼스트’ 눈길
-
4

분양7번가의 OK현수막, 게릴라현수막과 인터넷 홍보시스템이 만나 분양광고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다!!
-
5

[인물인터뷰]네트워크 마케팅 필독서!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저자 : 제임스 장(James Chang)
-
6

[회사소개]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주목 받는 '파트너코', 성장 거인의 탄생
-
7

[인물인터뷰]무엇이든 물어보살 257화 대안가정 이야기... 씨앗티움 공동체 유현진 대표를 만나다.
-
8

[전통무속특집보도] 서울 일산점집 꽃대신당 이화정 만신의 ‘한(恨)’을 예술로, ‘굿’을 철학으로.. 전통과 현대를 잇는 영적 실천의 기록!
-
9

[인물인터뷰] 해병대 정신! MZ세대 양훈엽 N잡러를 만나다. '홀로서기' 작사 작곡가 겸 펀드매니저, 인플루언서
-
10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 경쟁 구도 속, '에이펙스 청라'가 완성하는 청라오피스텔의 프리미엄 라이프!